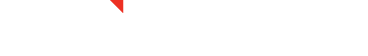"자율권 없는 지방은 성장 불가능… 청년·대학·산업 붕괴 모두 중앙집권 탓"
-

- ▲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미래도시혁신재단 주최 정책 세미나에서 지방 자율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하고 있다.ⓒ부산시
"부산 같은 대도시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권한은 고작 20%입니다."박형준 부산시장이 중앙집권체제를 향해 날카로운 경고를 던졌다.수도권 쏠림, 지방대 붕괴, 청년 유출, 산업 침체 등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문제들이 모두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진단이다.박 시장은 23일 미래도시혁신재단이 주최한 제10회 정책 세미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의 특별대담에서 "지방 자율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싱가포르와 미국 사례를 거론하며 현행 중앙집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역경쟁력은 영원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주정부는 자율경쟁, 우리는 중앙 승인만 기다려"박 시장은 먼저 싱가포르와 미국 주정부를 언급하며 "그들이 기업을 끌어모으는 힘은 결국 '자율'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싱가포르가 왜 세계의 돈을 끌어들이느냐? 소득세·법인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50개 주 역시 국토 이용, 세제, 기업 인센티브를 각자 결정한다. 애리조나 같은 시골 주가 인공지능(AI) 특화지로 성장한 것도 대학이나 주정부가 마음껏 인재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한국의 지방정부는 "국고보조금 메뉴에 맞춰 움직이느라 AI도 찔끔, 퀀텀컴퓨터도 찔끔 하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박 시장은 비판했다.박 시장은 쓸모 있는 그린벨트와 쓸모 없는 그린벨트,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까지 "현장을 모르는 중앙 관료의 탁상공론으로 1년씩 묶이는 현실"이라고도 비판했다.이어 "부산 같은 도시는 사실상 작은 나라다.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을 수행하는데 권한은 고작 20%"라고 짚은 박 시장은 "헌법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명시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엑소더스, 수도권 삶은 '박탈·외로움·높은 비용'뿐"박 시장은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을 '청년 엑소더스'로 규정했다.박 시장은 "부산에서만 한 해 1만3000명이 서울로 떠났다. 그런데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았느냐? 원룸 값은 부산의 3배, 출퇴근은 지옥, 친구 한 명 없고 외로움과 박탈감만 남는다. 지방청년의 대부분이 개고생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수도권 집중이 불러온 결과는 청년층의 주거·소득 불안정, 낮은 출산율이라고 박 시장은 언급했다.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역에 정주 여건이 갖춰졌다면 청년들은 더 많이 결혼하고 더 많이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며 "이것이 무슨 국가적 효율이냐"고 반문했다.■ "해답은 대학"… "지방대 죽인 것은 교육부" 직설 비판박 시장은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구조의 실패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지역의 대학들을 왜 누가 죽였느냐? 저는 교육부 책임이 엄청 크다고 생각한다"고 자문자답했다.박 시장은 교육부의 '지표 관리식 대학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교육부가 지방대학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전부 지표로 관리했다. 교수대 학생 수 맞춰라, 연구시설 어떻다, 재정 지원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마약 주듯 돈을 주니, 지방대는 자생적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든 교육부 지원을 받아 근근이 버티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방대는 살 수 없다"고 박 시장은 못 박았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해법으로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생태계를 구성하는 지산학(知産學) 모델을 제시했다."대학이 지역 기업·산업과 함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이 먹고살려면 지역경제와 붙어 살아야 한다. 이 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박 시장은 또 부산시의 지·산·학 정책이 교육부 라이즈(RISE)사업으로 전국화한 과정을 설명하며 "라이즈는 대학 구조를 바꾸는 첫 실험"이라고 평가했다."라이즈 사업을 통해 정부 최초로 1500억 원의 포괄보조금을 받았고, 부산시도 500억 원을 추가해 대학·지자체·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상기한 박 시자은 "각 대학이 특성화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체제로 전환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기업유치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인재 있느냐'는 질문"이라며 "부산이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한화조선·대우조선·현대중공업 등 빅3 연구개발(R&D)센터가 모두 부산으로 왔다"고 강조했다.■ "청년 떠나면 도시도 죽어"… 1만 가구 공공주택·무상보육으로 승부수박 시장은 청년들이 "여기서 살면 기회가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지방도시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역설했다.박 시장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청년들에게는 분명한 기회를 보여줘야 한다"며 부산이 추진 중인 정주(定住)정책들을 소개했다.박 시장은 먼저 주거정책을 꺼냈다. "2030년까지 1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청년에게 사실상 무료로 제공한다"며 "청년은 6년, 결혼하면 7년, 아이를 낳으면 20년, 둘을 낳으면 영구 거주까지 가능하다. 금년부터 1300가구를 공급했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이어 박 시장은 "부산에서 정착하고 결혼하려는 친구들에게 '집이 없어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이를 위해 부산은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정부보다 먼저 시행 중이다.박 시장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5세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한다"며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돈을 제외하고, 공적 보육기관에서 드는 비용은 부모 부담금 0원이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자랑했다.청년 대상 문화환경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박 시장은 자평했다. "부산은 이미 재미있는 도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서울 홍대·성수동만 그릴 것이 아니라, 부산이 더 특색 있는 청년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부산만큼 재밌는 곳도 없다"고 박 시장은 주장했다."결국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가 살아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인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면, 부산은 더 잘할 수 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