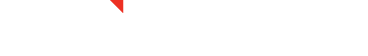'저부담-저복지' 주장에 'OECD 통계로 복지장사' 맞대응
-
복지-증세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자의적인 OECD 통계 인용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0.4%에 불과해 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가장 낮았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국민부담률도 24.3%로 OECD 평균 34.1%에 10% 포인트 차이가 나 바닥권이라고 했다.'저부담-저복지'를 내세운 쪽에서는 즉각 언론보도 등을 인용해 "복지 과잉이나 증세없는 복지 주장은 허구"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복지과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표 장사도 모자라 OECD 통계로 또다시 복지장사에 나서고 있다"고 힐난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통계인용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적합하다고도 볼 수 없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지난해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 올해 복지 예산은 115조7000억원이다. 2006년 56조원에서 9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올 한 해 총예산 375조4000억원의 30%다. 이같은 복지 예산은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 우리 복지수준이 1960년대 유럽 수준에 불과하다며 혹평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 2014년 10.4%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정부의 주요 복지 관련 예산과 사회보험을 더한 비용으로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민간 부문을 뺀 지표다.OECD 34개 회원국은 저마다 경제사회적 여건이 다르다. 회원국 종다수가 오랫동안 복지정책을 펼쳐온 유럽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늘 조심스럽다. 우리나라가 복지과잉 등의 폐해로 신음하는 그리스나 에스토니아 등 보다도 못하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쉽지않다.OECD 국가중 우리처럼 단박에 복지수요가 늘어난 국가는 없다. 더욱이 선택적 복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나마도 일부는 국가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오히려 복지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게 현실이다.그렇다면 국민들은 부담률을 높이고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갤럽이 1월 27~29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민 65%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증세를 해서 복지를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서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JTBC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실은 정반대였다.구멍 난 국가 재정에 대한 해법을 물은 결과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46.8%에 달했다. 세금을 올리자는 답변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세금을 더 내는 건 부담이라는 반응이었다. 만일 증세를 해야 한다면 법인세를 올리자는 의견이 59.7%로 개인이 내는 소득세를 올리자는 의견 6.0%의 10배에 달했다.같은 시기 서울신문이 조세·재정 전문가와 전직 경제관료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는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40%는 증세의 대안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의 지출 구조조정과 선별적 전환 등을 제시했다. 증세세목으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를 꼽았다. 증세필요성과 증세세목에서 일반국민들과 차이가 느껴진다.단지 평균적인 수치 비교가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논거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곧잘 미래가 달린 정책들을 논의할 때 OECD 평균 같은 단순한 수치비교에서 곧바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적지 않다. 국민소득 대비 복지지출의 수준이나 국가채무 수준을 논의할 때가 그렇다.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쪽은 "법인세를 올린다고 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다"며 OECD 평균과 비교해 다른 나라들도 그 정도 수준이니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교 자체야 할 수 있지만 논리적 논의에는 한참이 모자란다.예컨데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기업가 정신이 떨어져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경제성장에도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도 있다. 한 논문은 법인세율 10% 인하가 대략 1% 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법인세를 올려 복지비용을 메우면 소득 등 간접손실이 66조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치열한 정책 논의는 필요하지만 단순한 수치 비교의 오류에 빠져 일방의 주의 주장에 함몰되는것은 경계해야 한다.[사진=뉴데일리 DB]